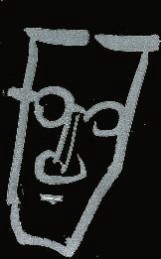물오른 봄 버들가지를 꺾어 들고 들어가도 문안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나는 서울서 꾀꼬리 소리를 들으며 살게 되었다.
새문 밖 감영 앞에서 전차를 나려 한 십 분쯤 걷는 터에 꾀꼬리가 우는 동네가 있다니깐 별로 놀라워하지 않을 뿐 외라 치하하는 이도 적다.
바로 이 동네 인사들도 매간[每間]에 시세가 얼마며 한 평에 얼마 오르고 나린 것이 큰 관심거리지 나의 꾀꼬리 이야기에 어울리는 이가 적다.

이삿짐 옮겨다 놓고 한밤 자고 난 바로 이튿날, 햇살 바른 아츰, 자리에서도 일기도 전에 기왓골이 옥玉인 듯 짜르르 짜르르 울리는 신기한 소리에 놀랐다.
꾀꼬리가 바로 앞 나무에서 우는 것이었다.
나는 뛰어나갔다.
적어도 우리집 사람쯤은 부주깽이를 놓고 나오던지 든 채로 황황히 나오던지 해야 꾀꼬리가 바로 앞 나무에서 운 보람이 설 것이겠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다시도 무딀 줄이 있으랴.
저녁때 한가한 틈을 타서 마을 둘레를 거니노라니 꾀꼬리뿐이 아니라 까토리가 풀섶에서 푸드득 날아갔다 했더니 장끼가 산이 찌르렁 하도록 우는 것이다.
산비둘기도 모이를 찾아 마을 어귀까지 나려오고, 시어머니 진짓상 나수어다 놓고선 몰래 동산 밤나무 가지에 목을 매어 죽었다는 며누리의 넋이 새가 되었다는 며누리새도 울고 하는 것이다.
며누리새는 외진 곳에서 숨어서 운다. 밤나무꽃이 눈같이 흴 무렵 아츰저녁 밥상을 받을 때 유심히도 극성스럽게 우는 새다. 실큿하게도 슬픈 우름에 정말 목이 매는 소리로 끝을 맺는다.
며누리새의 내력을 알기는 내가 열세 살 적이었다.
지금도 그 소리를 들으면 열세 살 적 외롬과 슬픔과 무섬탐이 다시 일기에 며누리새가 우는 외진 곳에 가다가 발길을 도리킨다.
나라세력으로 자란 솔들이라 고스란히 서 있을 수 밖에 없으려니와 바람에 솔 소리처럼 안윽하고 서럽고 즐겁고 편한 소리는 없다. 오롯이 패잔한 후에 고요히 오는 위안 그러한 것을 느끼기에 족한 솔 소리, 솔 소리로만 하더라도 문 밖으로 나온 값은 칠 수밖에 없다.
동저고리 바람을 누가 탓할 이도 없으려니와 동저고리 바람에 따르는 홋홋하고 가볍고 자연과 사람에 향하야 아양떨고 싶기까지 한 야릇한 정서 그러한 것을 나는 비로소 알아내었다.
팔을 걷기도 한다. 그러나 주먹은 잔뜩 쥐고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 많이도 흉을 잡히는 입을 벌리는 버릇도 동저고리 바람엔 조금 벌려 두는 것이 한층 편하고 수얼하기도 하다.
무릎을 세우고 안으로 깍지를 끼고 그대로 아모데라도 앉을 수 있다. 그대로 한나절 앉었기로소니 나의 게으른 탓이 될 수 없다. 머리 우에 구름이 절로 피명 지명하고 골에 약물이 사실 솟아 주지 아니하는가.
뻐끔채꽃, 엉겅퀴 송이, 그러한 것이 모다 내게는 끔찍한 것이다. 그 밑에 앉고 보면 나의 몸동아리, 마음, 얼, 할 것 없이 호탕하게도 꾸미어지는 것이다.
사치스럽게 꾸민 방에 들 맛도 없으려니와, 나히 30이 넘어 애인이 없을 사람도 뻐끔채 자주꽃 피는 데면 내가 실컷 살겠다.
바람이 자면 노오란 보리밭이 후끈하고 송진이 고혀오르고 뻐꾸기가 서로 불렀다.
아츰 이슬을 흩으며 언덕에 오를 때 대수롭지 안히 흔한 달기풀꽃이라도 하나 업수히 녀길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적고 푸르고 이쁜 꽃이었던가 새삼스럽게 놀라웠다.
요렇게 푸를 수가 있는 것일까.
손끝으로 익깨어 보면 아깝게도 곱게 푸른 물이 들지 않던가. 밤에는 반딧불이 불을 켜고 푸른 꽃잎에 오무라붙는 것이었다.
한번은 달기풀꽃을 모아 잉크를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한테 편지를 염서艶書같이 써 부치었다. 무엇보다도 꾀꼬리가 바로 앞 나무에서 운다는 말을 알이었더니 안악安岳 친구는 굉장한 치하 편지를 보냈고 장성長城 벗은 겸사겸사 멀리도 집아리를 올라왔었던 것이다.
그날사 말고 새침하고 꾀꼬리가 울지 않았다. 맥주 거품도 꾀꼬리 울음을 기달리는 듯 고요히 이는데 장성長城벗은 웃기만 하였다.
붓대를 희롱하는 사람은 가끔 이러한 섭섭한 노릇을 당한다.
멀리 연기와 진애를 걸러 오는 사이렌 소리가 싫지 않게 곱게와 사라지는 것이었다.
꾀꼬리는 우는 제철이 있다.
이제 계절이 아조 바뀌고 보니 꾀꼬리는 커니와 며누리새도 울지 않고 산비둘기만 극성스러워진다. 꽃도 잎도 이울고 지고 산국화도 마지막 스러지니 솔 소리가 억세여 간다.
꾀꼬리가 우는 철이 다시 오고 보면 장성長城벗을 다시 부르겠거니와 아조 이우러진 이 계절을 무엇으로 기울 것인가.
동저고리 바람에 마고자를 포기어 입고 은단초를 달리라.
꽃도 조선 황국은 그것이 꼿 중에는 새 틈에 꾀꼬리와 같은 것이다. 내가 이제로 황국을 보고 취하리로다. (정지용, '꾀꼬리와 국화',『삼천리문학』, 1938.1.)

음악가 계정식 씨 주택
-금화산 아래 깃들인 비둘기
서대문밖 연희장 주택지 중에도 가장 아담한 곳.. 뒤로는 금화산의 송림을 배경으로 하고 옆으로는 애기릉의 울림鬱林을 벗으로 하여 장차 날려는 비둘기같이 아담한 주택은 음악가 계정식 씨의 주택이다. 기자는 어느날 대문을 노크하고 내의내의來意를 밝혔으나 계정식 씨는 어디 가고 부인이 대신 맞아준다.

기자는 대문을 열고 뜰 안으로 들어섰다. 네 귀를 잠자리 날개같이 바싹 들고 남향한 문화주택 전면은 모두 분합을 드리고 유리창을 하여 창만 여러개고 부억은 뒤로 붙여서 보이지 안고 방만이 순백의 커텐 아래 고요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뜰 안 정원에는 조그마한 밭이 있어서 이집 주인들이 좋아하는 온갖 작물을 심어놓았다. 꽃으로 봉산화鳳山花, 홍초 등이 있고 또는 옥수수 1년[생]감 등이 심어 있다.
"계 선생은 어떤 꽃을 좋아하십니까?"
"그이는 화초는 그리 좋아하시지 않는답니다."
하고 부인은 대답한다.
"그러면 이것들은 누가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하십니까?"
"우리 여자들이 하지요."
부인은 빙긋이 웃으며 대답하는데 아마 식모와 부인이 손수 심고 기르는 모양이오, 계 씨는 그런 방면에는 아주 무관심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문 옆으로 호박나무가 뻗어서 줄기줄기 올라가는데 꽃이 누렇게 몇 송이 피었다. 이 때 세파트 한 마리가 노상 친한 듯이 기자의 가슴에 펄떡 기어오른다. 이 개는 특히 부인이 사랑하여 기르는 개인 듯하다. 기자는
"이 집터는 몇 평입니까?"
하고 좀 복덕방 사람 같은 말을 건넸다.
"72평인데 도합 18간間으로 방은 셋입니다."
하고 부인은 친절히 대답한다. 우편 방은 계 씨의 방, 그 다음이 시어머니방인데, 가운데로 복도가 있고 뒤로는 부엌과 목욕실과 지하실이 있다.
그리고 시멘트로 장독대를 만들고 장독대 밑으로 지하실이 있는데 이 지하실은 김치광[庫]이라고 부인은 설명하여 주신다. 이 집은 작년에 건축한 집[이다.] (『조광』, 1937. 9.)
'근대문학과 경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태준 - 점경 (0) | 2019.05.17 |
|---|---|
| 피천득 - 장미 (0) | 2019.05.10 |
| 이상李箱 - 조춘점묘早春點描 (0) | 2019.05.09 |
| 이상李箱 - 추등잡필秋燈雜筆 (0) | 2019.05.08 |
| [유진오 - 가을 (1)] 기호의 산보 (0) | 2019.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