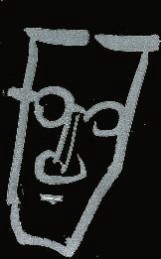[...] 공덕리 위를 지날 때에는 멀리 독립문 밖 무학재 넘어 홍제원洪濟院 시내溪의 모래밭까지 보이는데 그곳은 내가 보통학교에 다닐 때에 운동연습으로 또는 원족회遠足會로 자주 갔던 곳이라 마음에 그윽히 반가웠습니다. (안창남, '창공에서 본 경성과 인천', 『개벽』, 1923.1.)

**
햇발이 퍼지니까, 땅빛이 검숭해지고 해빙 머리나 된 듯이 푸근하다. 무악재 고개를 넘어서서는 인력거꾼이 헉헉하며 연해 땀을 씻는 것을 위에 앉아서 내려다보니 선선하던 생각도 잊어버렸다.
"여기만 나와두 시골 같아서 시원하지?"
앞에 탄 종엽이가 고개를 좀 꼬며 말을 붙인다.
"나온 김에 먼 데로 여행이나 좀 했으면 좋겠어."
문경이는 종엽이 말에 찬성이라는 뜻으로 이런 소리를 한다.
"어디루……?"
"아무 데나! 나가 봐서 재미 없거든 곧 들어옵시다. 첫째 하룻밤이라도 자려면 금침이 있어야지."
그도 그렇다고 생각하였다. 몸뚱어리들만 나섰으니, 물론 오래 묵자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종엽이 생각에는 이삼 일쯤은 묵으려 하였던 것이다.
"금침 하나만 있으면 둘이 자지."
종엽이는 이런 소리를 하면서 문경이의 그 희고 보드라운 속살의 감촉을 생각하고는 생글한다. 남성이 미인에게 대한 공상적 쾌감과는 다르겠지만, 남성적인 종엽이는 문경이에게 대하여 차차 동성연애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었다.
인력거는 홍제원에서 모래사장을 휘돌아 들어가는 것이었다. 모래가 얼어붙어서 발이 푹푹 빠지지는 않지만, 타고 앉았으니보다도 내려서 걷는 편이 도리어 날 것 같다. 그러나 큰 냇속 같은 이런 데로 휘어드니까 겁도 좀 나는 것이었다. 남자든 여자든, 인력거를 탁 내려놓고 덤벼든다면 당해 낼 도리가 없을 것이라는 공상을 하고 앉았으니, 문경이는 가슴속이 오그라붙는 듯하다. 종엽이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피차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염상섭, 『무화과』, 1932)

**
나는 그때, 서대문턱 전차정류장에서 그를 만나가지고 어디로 걸어야 좋을지 몰랐다.
"어는 쪽으로 걸을까요?"
"전 몰라요."
하고 그는 붉어진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동무나 선생을 만날까봐 얼른 그 자리를 떠나자는 눈치였다.
"이 성밑으로 올라갈까요?"
그는 잠자코 걷기 시작했다. 한참 올라가다가,
"그럼 이 산[인왕산]위로 올라가 볼까요?"
하고 향촌동 위를 가리켰더니,
"거긴 동무들이 산보 잘 오는 데에요."
하였다. 할 수 없이 나는 중학때 왼쪽으로 진관사津寬寺 가던 길을 생각하였다.
서대문형무소 앞을 지나 무학재를 넘어서면 저 세검정에서 내려오는 개천이 모래도 곱고, 물도 맑았다. 철도 그때와 같이 가을이라 곡식 익는 향기와 들국화와 맑은 하늘과 새하얀 모래길이 곧 우리를 반길 것만 같았다. 그래서 먼지가 발을 덮는 서대문형무소 앞을 참고 걸어서 무학재를 넘어섰다. 고개만 넘어서면 곧 길이 맑고 수정 같은 개천이 흐르리라고 믿었던 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얼마를 걸어도 먼지만 풀석풀석 일어난다.
거름마차만 그 코를 찌르는 냄새에다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간다. 자동차가 한번 지나면 한참씩 눈도 뜰 수가 없고 숨도 쉴 수가 없다. 벌써 한 시간이나 거의 소비했다. 조용한 말이라고는 한 마디도 못해 보았다. 그 세검정서 내려오는 개천은 여간 더 멀리 걷기 전에는 만날 것 같지도 않았다. (이태준, '장마', 1935)

수중 강행군
어느 해[구한말] 늦은 여름이었다. 원족을 가는 때였는지 행군 연습을 하는 때였는지, 3백여 명 학생을 4열 종대로 서대문 감옥 앞 무악재 고개를 넘어 홍제원 내를 끼고 돌아 세검정을 거쳐서 창의문으로 해서 효자동으로 돌아오기로 하고 떠났다. 다른 선생들은 학감까지 섞여서 뒤에 떨어져 오고 맨 선두에는 우리 전장 선생 콩나물 선생이 서서 행군을 했다.
그런데 나팔 소리에 맞춰서 무악재 고개를 넘어가기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마침 장마 뒤끝이라 홍제원 그 큰 시내는 시뻘건 물이 한강물같이 흘러서 논과 길까지 물에 덮였다. 누가 호령을 한 것도 아니지만 선두의 나팔수는 나팔을 그치고 일동은 딱 전진을 그치고 섰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말이다. 선두 지휘가 다른 사람 아닌 콩나물 선생이 어찌되었을까 말이다. 뒤에 떨어져 따라오는 학감과 다른 선생들을 기다려 의논해야 할 것이 당연한 일이건만 그 점이 우리 콩나물 선생의 남다른 점이라 선생은 공연히 얼굴을 붉혀가지고
"이놈들아, 누가 가지 말라고 호령을 하더냐. 왜 이러고 섰어."
"아니 물속으로 들어가요?"
"이놈아, 물이거나 불이거나 서라는 호령이 없으면 그냥 나아가야지."
"그렇지만 이 물속으로 어떻게 그냥 나아갑니까?"
"이놈아 전장에 나아가다가도 물이 있으면 설 테냐?"
전장이라는 말에는 할 말이 없다. 대답은 못하고 그렇다고 나아갈 수는 없고 쩔쩔매고 섰노라니까, 콩나물 선생님이 뒤로 10여 보 물러서더니 전군을 향해 벽력 같은 큰 소리로
"앞으로 갓!"
하고 소리를 쳤다.

여름이지만 조선 버선이니까 모두 솜버선을 신었고, 거기다 옛날 중신을 신은 학생들은 그냥 철벅철벅 시뻘건 물속으로 행진해 들어갔다. 물이 적기나 한가. 시뻘건 흙물이 거의 정강이까지 오르니 걸음이 잘 걸리지 않는다.
"나팔을 불어, 나팔을 불어. 왜 안 불어."
물에 잠겨서 걸음은 안 걸리고 옷은 몸에 휘감기는데 나팔을 불라니 거의 죽을 지경이다.
뒤의 학생들은 철벅철벅 물속으로 가면서도 모시 두루마기만은 적시지 않으려고 걷어 치켜 쥐고 나아간즉
"두루마기 붙잡지 말아. 손을 놔. 손을 놔."
하는 수 없이 3백 명 학생은 시뻘건 물속으로 그냥 주춤주춤 행진해 나아갔다.
학생은 학생들대로 이미 물속으로 행진해 들어갔거니와 뒤에 멀거니 떨어져 오던 학감 각하와 다른 선생님들은 물가까지 와보고 기절했다. 물이 이렇게 끼었으면 의논할 여부도 없이 도로 회군해 갈 것이다. 그런데 귀염둥이 콩나물 선생이 벌써 학생들을 끌고 물속으로 멀리 행진을 해놓았으니 이 노릇을 어찌할꼬 하며 앙천대곡仰天大哭을 한 꼴이었다.
"저런 미친 사람 미친 사람. 그 사람이 미쳤어, 미쳤어. 미쳤길래 그러지."
학감 각하께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야단이시지만 선생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합쳐서
"여보─ 여보─"
하고 소리를 질러 불러도 물 소리와 나팔 소리 때문에 벌써 꽤 멀리 수중 행군을 하고 있는 콩나물 선생 귀에 들릴 까닭이 없었다. 하다하다 못해 학감 각하는 도로 돌아 들어가고 다른 선생들은 우는 얼굴을 하면서 두루마기만 들쳐 들고 물속으로 따라나섰다.
무엇이 유쾌한지 콩나물 선생은 신이 나서
"불어, 불어. 나팔을 쉬지 말고 불어."
하면서 뒤에서 다른 선생들이 갖은 욕을 다 퍼부으면서 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전진을 했다.
이리하여 세검정을 지나 창의문으로 기어오를 때는 물속에서 나온 쥐 모양으로 후줄근해지고 중신은 물에 불어서 질척질척해졌다. 그래도 나팔을 불면서 넘어가는데, 그 중에는 기왕 젖은 옷이라 일부러 물속에 앉았다 가는 학생도 있어서 그 꼴이 우습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그 이튿날 감기가 들어서 못 온다는 학생이 40여 명이나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잔뜩 벼르고 있는 학감 영감님께 우리 용감한 콩나물 선생은 적잖이 기름을 짜이고 나왔다. (방정환, '호랑이똥과 콩나물 선생', 『학생』, 1929)
**
도성민들의 상언에 따라 도성의 금표를 개정할 것을 명하다
도성都城의 금표禁標를 개정할 것을 명하니 도민都民들의 상언上言을 따른 것이다. 당초 서울의 금표는 십 리를 한정으로 하여 동·서·남 세 도道는 모두 하천河川으로 경계를 삼고 북쪽은 산등성이를 경계로 삼아 저서령猪噬嶺에서부터 연서延曙의 돌곶이고개石串峴에 이르기까지 두 내가 합류하는 곳으로 경계를 정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도성의 백성들이 옹암瓮巖의 서쪽 모래내沙川로 경계를 삼아 달라는 청을 하였으니, 대개 그곳에 잇대어 장사지내기繼葬 위함이었다. 임금이 묘당에 품처토록 하니,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모두 그것의 불가함을 아뢰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인구가 많이 불어나 서울 근교에는 한 조각의 노는 빈 땅이 없다.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나라의 은택이 백골白骨에게도 당연히 미치는 것이니, 모래내沙川를 경계로 삼도록 허락하라." (영조실록 11권, 1727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