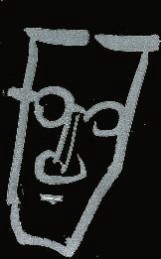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지는 벌써 오랜 일이다. 어느덧 7, 8년이 지냈으리라. 하건만 같이 있어 본 날을 헤아리면 단 일년이 될락말락 한다. 막 그의 남편이 서울서 중학을 마쳤을 제 그와 결혼하였고, 그러자마자 고만 동경東京에 부급[유학]한 까닭이다. 거기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였다. 이 길고 긴 세월에 아내는 얼마나 괴로왔으며 외로왔으랴! 봄이면 봄, 겨울이면 겨울, 웃는 꽃을 한숨으로 맞았고 얼음같은 베개를 뜨거운 눈물로 데웠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쓸쓸할 제, 얼마나 그가 그리웠으랴! 하건만 아내는 이 모든 고생을 이를 악물고 참았었다. 참을 뿐이 아니라 달게 받았었다. 그것은 남편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는 생각이 그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준 까닭이었다. 남편이 동경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공부를 하고 있다. 공부가 무엇인가? 자세히 모른다. 또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어찌하였든지 이 세상에 제일 좋고 제일 귀한 무엇이라 한다. 마치 옛날 이야기에 있는 도깨비의 부자富者방망이 같은 것이어니 한다.
옷 나오라면 옷 나오고, 밥 나오라면 밥 나오고, 돈 나오라면 돈 나오고…… 저 하고 싶은 무엇이든지 청해서 아니되는 것이 없는 무엇을, 동경에서 얻어가지고 나오려니 하였었다. 가끔 놀러오는 친척들이 비단 옷 입은 것과 금지환(金指環) 낀 것을 볼 때에 그 당장엔 마음 그윽히 부러워도 하였지만 나중엔 '남편만 돌아오면……' 하고 그것에 경멸하는 시선을 던지었다. (현진건, '술 권하는 사회', 1922)
**
어머니는 역시 글을 쓰는 것보다는 월급쟁이가 몇 갑절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재주 있는 내 아들은 무엇을 하든 잘하리라고 혼자 작정해 버린다. 아들은 지금 세상에서 월급 자리 얻기가 얼마나 힘드는 것인가를 말한다. 하지만 보통학교만 졸업하고도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회사에서 관청에서 일들만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또 동경엘 건너가 공불하고 온 내 아들이, 구하여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
구보는 아이에게 한 잔의 가배차加琲茶와 담배를 청하고 구석진 등탁자로 갔다. 나는 대체로 얼마가 있으면ㅡ 그의 머리 위에 한 장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어느 화가의 ‘도구유별전渡歐留別展’. 구보는 자기에게 양행비洋行費가 있으면, 적어도 지금 자기는 거의 완전히 행복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동경에라도ㅡ 동경도 좋았다. 구보는 자기가 떠나온 뒤의 변한 동경이 보고 싶다 생각한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34)

**

이 바다 물결은
예부터 높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은
두려움보다 용기가 앞섰다.
산불이
어린 사슴들을
거친 들로 내몰은 게다
대마도를 지나면
한가닥 수평선 밖엔 티끌 한점 안 보인다.
이곳에 태평양 바다 거센 물결과
남진南進해 온 대륙의 북풍이 마주친다.
몽블랑보다 더 높은 파도,
비와 바람과 안개와 구름과 번개와,
아세아亞細亞의 하늘엔 별빛마저 흐리고,
가끔 반도엔 붉은 신호등이 내어 걸린다.
아무러기로 청년들이
평안이나 행복을 구하여,
이 바다 험한 물결 위에 올랐겠는가?
첫 번 항로에 담배를 피우고
둘째번 항로엔 연애를 배우고,
그 다음 항로에 돈맛을 익힌 것은,
하나도 우리 청년이 아니었다.
청년들은 늘
희망을 안고 건너가,
결의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들은 느티나무 아래 전설과,
그윽한 시골 냇가 자장가 속에,
장다리 오르듯 자라났다.
그러나 인제
낯선 물과 바람과 빗발에
흰 얼굴은 찌들고,
무거운 임무는
곧은 잔등을 농군처럼 굽혔다.
나는 이 바다 위
꽃잎처럼 흩어진
몇 사람의 가여운 이름을 안다.
어떤 사람은 건너간 채 돌아오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돌아오자 죽어 갔다.
어떤 사람은 영영 생사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아픈 패배에 울었다.
-그 중엔 희망과 결의와 자랑을 욕되게도 내어 판 이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지금 기억코 싶지는 않다.
오로지
바다보다도 모진
대륙의 삭풍 가운데
한결같이 사내다웁던
모든 청년들의 명예와 더불어
이 바다를 노래하고 싶다.
비록 청춘이 즐거움과 희망을
모두 다 땅속 깊이 파묻는
비통한 매장의 날일지라도,
한번 현해탄은 청년들의 눈앞에,
검은 상장喪帳으르 내린 일은 없었다.
오늘도 또한 나이 젊은 청년들은
부지런한 아이들처럼
끊임없이 이 바다를 건너가고, 돌아오고,
내일도 또한
현해탄은 청년들의 해협이리라.
영원히 현해탄은 우리들의 해협이다.
삼등 선실 밑 깊은 속
찌든 침상에도 어머니들 눈물이 배었고,
흐린 불빛에도 아버지들 한숨이 어리었다.
어버이를 잃은 어린아이들의
아프고 쓰린 울음에
대체 어떤 죄가 있었는가?
나는 울음소리를 무찌른
외방 말을 역력히 기억하고 있다.
오오! 현해탄은, 현해탄은,
우리들의 운명과 더불어
영구히 잊을 수 없는 바다이다.
청년들아!
그대들의 조약돌보다 가볍게
현해玄海의 물결을 걷어찼다.
그러나 관문 해협 저쪽
이른 봄 바람은
과연 반도의 북풍보다 따사로웠는가?
정다운 부산 부두 위
대륙의 물결은
정녕 현해탄보다도 얕았는가?
오오! 어느 날
먼먼 앞의 어느 날,
우리들의 괴로운 역사와 더불어
그대들의 불행한 생애와 숨은 이름이
커다랗게 기록될 것을 나는 안다.
1890년대의
1920년대의
1930년대의
1940년대의
19××년대
........
모든 것이 과거로 돌아간
페허의 거칠고 큰 비석 위
새벽 별이 그대들의 이름을 비출 때,
현해탄의 물결은
우리들이 어려서
고기떼를 좇던 실내(川)처럼
그대들의 일생을
아름다운 전설 가운데 속삭이리라.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바다 높은 물결 위에 있다. (임화, '현해탄', 1938)
**
봄이 오던 아침, 서울 어느 쪼그만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
처럼 기차를 기다려,
나는 플랫폼에 간신한 그림자를 떨어트리고, 담배를 피웠다.
내 그림자는 담배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 한 떼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나래 속을 속 속 햇빛에 비춰 날았다.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다 주어, (윤동주, '사랑스런 추억' (앞), 1942.5.13.)
**
[...]
봄은 다 가고 ─ 동경東京 교외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옛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또 누구를 기다려 정거장 가까운 언덕에서 서성거릴 게다.
─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윤동주, '사랑스런 추억', 1942.5.13.)

**
으스럼히 안개가 흐른다. 거리가 흘러간다. 저 전차, 자동차, 모든 바퀴가 어디로 흘리워 가는 것일까? 정박할 아무 항구도 없이, 가련한 많은 사람들을 싣고서, 안개 속에 잠긴 거리는,
거리 모퉁이 붉은 포스트 상자를 붙잡고 섰을라면 모든 것이 흐르는 속에 어렴풋이 빛나는 가로등, 꺼지지 않는 것은 무슨 상징일까? 사랑하는 동무 박朴이여! 그리고 김金이여! 자네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끝없이 안개가 흐르는데,
'새로운 날 아침 우리 다시 정답게 손목을 잡아보세' 몇 자 적어 포스트 속에 떨어뜨리고, 밤을 새워 기다리면 금휘장에 금단추를 삐었고 거인처럼 찬란히 나타나는 배달부, 아침과 함께 즐거운 내림來臨,
이 밤을 하염없이 안개가 흐른다. (윤동주, '흐르는 거리', 1942.5.12.)
**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 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 (윤동주, '쉽게 쓰여진 시', 1942.6.3.)
"이제 이 병이 좀 나으면 도쿄에 한번 놀러 가야지.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뭣이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살아 생전에 다 해봐야 해."
어머니는 옆에서 그저 "그땐 저도 함께 데리고 가주세요"하고 장단을 맞추셨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도 때로는 상당히 상태를 비관하셨다.
"내가 죽으면 아무쪼록 느이 어머니 잘 모셔라."
[...]
"그런 약한 말씀 하지 마세요. 이제 곧 나으시면 도쿄에 나들이 하러 오실 거잖아요. 어머니도 함께 말이에요. 이번에 오시면 정말 놀라실거에요. 도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요. 새로운 전차 노선도 많이 생겼고, 전차가 지나가는 곳은 그 거리도 자연히 번화하죠. 게다가 구획 정비도 새로 했어요. 도쿄는 말이죠 1분 1초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나는 아버지를 어찌 대할지 몰라 쓸데없는 말까지 떠들었다. 그래도 시덥잖은 내 말을 듣고 아버지의 기분이 좀 나아지시는 것 같았다. (나쓰메 소세키, 『마음』, 오유리 옮김, 문예출판사, 2002[1914], 1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