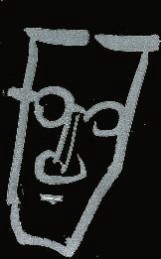[...] 그래도 명색이 다방이라 하여 놓고, 하루 매상고가 2,3원이나 그밖에 더 안 되니, 그걸 가지고 대체 무슨 수로 반 년이나 밀린 집세며, 식료품점 기타에 갚을 빚이며, 거기다 전기값에, 와사瓦斯[가스] 값에 [...] 그러한 것들을 모조리 속으로 꼽아 보느라면, 다음은 의례히 쓰디쓰게 다시는 입맛으로, 참말이지 아무러한 방도라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방란장의 젊은 주인은 저 모르게 엄숙한 표정을 지어도 보는 것이나, [...] 문득 뜻하지 않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온갖 빚장이들의 천속賤俗한 얼굴에, 그는 거의 순간에 눈살을 찌푸리고서, 누구보다도 제일에 그 집주인놈 아니꼬와 볼 수 없다고, 바로 어제도 아침부터 찾아와서는 남의 점에가 버티고 앉아, 무슨 수속을 하겠느니 어쩌느니 하고, 불손한 언사를 희롱하던 것이 생각나서, 무어 밤낮 밑지는 장사를 언제까지든 붙잡고 앉아 무어니무어니 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아주 시원하게 찻집이고 무어고 모두 떠엎어 버리고서 내 알몸 하나만 들고 나선다면, [...] 하다못해 시나소바[支那そば 중국식 국수] 장수를 하기로서니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고, 그는 거의 흥분이 되어 가지고 얼마 동안은 그러한 생각을 하기에 골몰이었으나, 사실은 말이 그렇지, 그것도 어려운 노릇이, 혹 자기 혼자라면 어떻게 그렇게라도 길을 찾는 수가 없지 않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한 그 뒤에, 돌아갈 집도, 부모도, 형제도 [...] 대체 자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고 하고, 그러한 것에 생각이 미치면, 그는 그만 제풀에 풀이 죽어 [...] (박태원, '방란장 주인',『시와 소설』 1권1호, 1936.3)

**
조선호텔 앞을 지나, 밤늦은 거리를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대낮에도 이 거리는 행인이 많지 않다. 참 요사이 무슨 좋은 일 있소. 맞은편에 경성 우편국 3층 건물을 바라보며 구보는 생각난 듯이 물었다. 좋은 일이라니... 돌아보는 벗의 눈에 피로가 있었다. 다시 걸어 황금정으로 향하며, 이를테면, 조그만 기쁨, 보잘것없는 기쁨, 그러한 것을 가졌소, 뜻하지 않은 벗에게서 뜻하지 않은 엽서라도 한 장 받았다는 종류의...
"갖구말구."
벗은 서슴지 않고 대답하였다. 노형같이 변변치 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받아 보지 못할 편지를, 그리고 벗은 허허 웃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허한 음향이었다. 내용증명의 서류우편, 이 시대에는 조그만 한 개의 다료를 경영하기도 수월치 않았다. 석 달 밀린 집세. 총총하던 별이 자취를 감추고 하늘이 흐렸다. 벗은 갑자기 휘파람을 분다. 가난한 소설가와, 가난한 시인과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34)
**
어느날 상허常虛의 경독정사耕讀精舍에서 몇 사람의 벗이 저녁을 먹은 일이 있다. 그 자리에서 시인 이상李箱은 쥘 르나르의 '전원수첩' 속에서 읽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가을날 방안에 가두어 두었던 카나리아는 난로불 온기를 봄으로 착각하고 그만 날개를 후닥이며 노래하기 시작하였다고─
우리는 르나르의 기지와 시심을 일제히 찬탄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시가 조류의 심리까지를 붙잡은 것은 아니다. 사실은 시인이 그 자신의 봄을 그리는 마음을 카나리아의 뜻없는 동작 속에 투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그 이야기를 꺼내 놓은 이상李箱의 마음에도 역시 봄을 그리는 생각이 남아 있어서 그 감정을 그러한 실 없는 듯한 이야기 속에서라도 풀어버리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대체 두 장의 재판소 호출장과 한 장의 내용증명 우편물과 한 장 내지 두 장의 금융조합 대부독촉장을 항상 가지고 댕겨야 하는 이 시인과 온갖 찬란한 형용사에 의하여 형용되는 다채스러운 봄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봄은 그러면 영구히 달콤한 것인가? (김기림, '봄은 사기사', 『중앙』, 1935.1.)

**
'제비'가 차차 경영 곤란에 빠졌을 때 어느 날 그의 모교 고공高工에서 전화로 그를 부른 일이 있다. 당시 신축 중에 있었든 신촌 이화여전 공사장에 현장 감독으로 가 볼 의향의 있고 없음을 물은 것이다.
"하루 일 원 오십 전이랍디다. 어디 담배값이나 벌러 나가 볼까 보오."
그리고 이튼날 벤또를 싸가지고 신촌으로 갔든 것이나 그 다음날은 다시 '제비' 뒷방에 언제나 한가지로 늦잠을 잤다.
"그 참 못하겠습디다. 벌이두 시원치 않지만 나 같은 약질은 어디 그런 일 견디어 나겠습디까."
그것은 사실이다. 그의 가난은 이렇게 그의 허약한 체질과 수년래의 절제 없는 생활이 가져온 불건강에도 말미암아 오는 것이었으나 집주인이 점방店房을 내어 달라고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 출두하라는 오전 9시에 대어 일어나는 재주가 없어 가장 불리한 결석 판결을 받고 그래 좀더 가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역시 너무나 철저한 그의 게으름을 들어 논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박태원, '이상李箱의 편모片貌', 『조광』, 1937.6)
**
'제비' 2층에는 사무소가 있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다. 사무소 아래층에 '제비'는 있었다. 이것은 얼른 들어 같은 말일 법 하되 실제에 있어 이렇게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런고 하면 그 빈약한 2층 건물은 그나마도 이상의 소유가 아니고 엄연히 사무소의 것으로 '제비'는 그 아래층을 세 얻었을 뿐. 그 셋돈이나마 또박또박 치르지 못하여 이상은 주인에게 무수히 시달림을 받고 내용증명의 서류우편 다음에 그는 마침내 그곳을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니까─ (박태원, '제비', 1939)